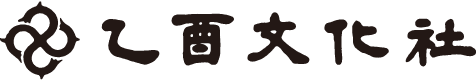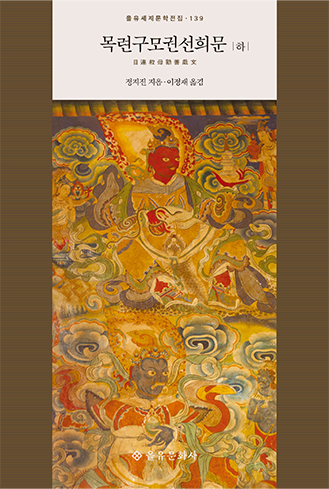
제57척 혼담 거절(議婚辭婚)
제58척 나복과 익리의 이별(主僕分別)
제59척 흰 원숭이의 항복(遣將擒猿)
제60척 길을 트는 흰 원숭이(白猿開路)
제61척 불경과 모친(挑經挑母)
제62척 내하교를 건너는 유씨(過耐河橋)
제63척 흑송림의 시험(過黑松林)
제64척 승천문과 귀문관(過升天門)
제65척 선인들의 승천(善人升天)
제66척 한빙지의 고난(過寒冰池)
제67척 화염산의 요괴(過火燄山)
제68척 난사하의 싸움(過爛沙河)
제69척 사화상의 합류와 나복의 탈화(擒沙和尙)
제70척 부처님 참배(見佛團圓)
제71척 개장(開場)
제72척 세존의 가르침(師友講道)
제73척 조씨 댁의 원소절(曹258府元宵)
제74척 유씨와 금노의 재회 (主婢相逢)
제75척 목련의 좌선(目連坐禪)
제76척 첫 번째 보전(一殿尋母)
제77척 두 번째 보전(二殿尋母)
제78척 청명절 성묘(曹氏淸明)
제79척 단 공자의 소원(公子回家)
제80척 새영을 탐하는 단 공자(見女託媒)
제81척 세 번째 보전(三殿尋母)
제82척 계모의 핍박(求婚逼嫁)
제83척 새영의 삭발과 도피(曹氏剪髮)
제84척 네 번째 보전(四殿尋母)
제85척 새영의 암자행(曹氏逃難)
제86척 다섯 번째 보전(五殿尋母)
제87척 부처님을 다시 뵙다(二度見佛)
제88척 암자에 도착한 새영(曹氏到庵)
제89척 새영과 부친의 상봉(曹公見女)
제90척 목련과 모친의 상봉(六殿見母)
제91척 부상의 상소(傅相救妻)
제92척 일곱 번째 보전(七殿見佛)
제93척 예물 거절(曹氏却餽)
제94척 괘등 의례(目連掛燈)
제95척 여덟 번째 보전(八殿尋母)
제96척 열 번째 보전(十殿尋母)
제97척 나귀로 변한 유가(益利見驢)
제98척 관음의 가르침(目連尋犬)
제99척 모친과의 재회(打獵見犬)
제100척 새영과의 상봉(犬入庵門)
제101척 목련의 귀가(目連到家)
제102척 우란대회에 가는 새영(曹氏赴會)
제103척 우란대회에 가는 십우(十友赴會)
제104척 우란대회(盂蘭大會)
해설: 목련의 모친 구조 이야기와 정지진의 『목련구모권선희문』
판본소개
정지진 연보
저자
정지진(鄭之珍)
유교와 불교, 도교의 철학을 집대성한 동아시아 최고의 고전 희곡인 『목련구모권선희문』의 저자 정지진은 자가 여석(汝席), 호는 고석(高石)으로 1518년 기문(祁門) 청계(淸溪)에서 태어났다. 약관의 나이에 현학(縣學) 입학생인 읍상생(邑庠生)이 되었지만, 눈병을 앓아 과거 시험의 답안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향시에는 급제하지 못하고 평생을 고향에서 살았다. 그러나 눈이 불편한 가운데에도 『춘추』와 『예기』 등을 비롯한 유가 경전을 공부하며 학문을 닦았고, 노년에는 향리에서 존경받아 현령으로부터 ‘성세기유(盛世耆儒, 성세의 유학 원로)’라는 편액을 하사받았다. 대표작인 『목련구모권선희문』 이외에도 희곡 『오복기(五福記)』 등을 남겼고 정씨 족보 편수에도 참여했다. 그의 일생은 입신양명의 관점에서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고향에서 친구들과 널리 사귀며 효도와 공경으로 덕을 쌓았고 가문에 공을 세우며 선비로서 충실한 삶을 살다가 1595년 타계했다.
『불설우란분경』에서 짧게 묘사된 ‘목련구모’ 설화는 석가의 수제자 목련이 지옥에 빠진 모친을 구해 내는 인도의 이야기인데, 중국으로 건너와 당송(唐宋) 시대에 크게 보강되어 「대목건련명간구모변문(大目犍連冥間救母變文)」, 『불설대목련경(佛說大目連經)』, 「목련구모잡극(目連救母雜劇)」 등의 여러 텍스트가 지어졌고, 원명(元明) 시대에는 많은 보권(寶卷) 작품들이 쏟아져 나와 더욱 다양하게 확장되고 변이되면서 중요한 문화 현상을 형성하였다. 『목련구모권선희문』은 이때까지 전승된 목련구모 설화의 주요 내용을 집대성하고 당시의 새로운 사상적 조류를 반영해 새로운 차원을 개척했다고 평가받는 고전이다.
역자
이정재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중국 구비연행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근세 중국 공연문화의 현장을 찾아서』, 『중국 구비연행의 전통과 변화』, 『중국공연예술』(공저), 역서로는 『도화선』, 『모란정』(공역), 『희곡 서유기』, 『근대 중국의 언어와 역사』, 『만유수록 역주 1, 2』(공역), 『구미환유기(재술기) 역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