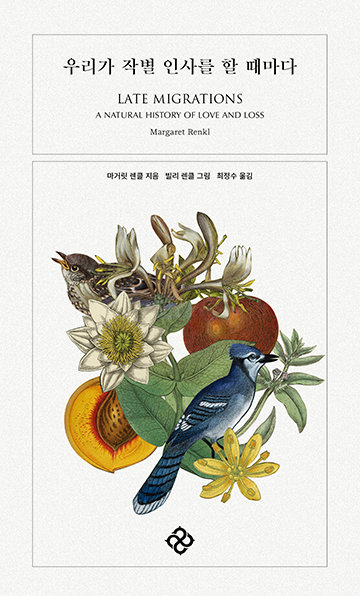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자연으로부터 배운
상실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
집굴뚝새는 자기 영역에 들어온 작은 새들을 죽인다. 어치는 다른 새들의 새끼를 잡아먹는다. 시인이자 수필가인 마거릿 렌클이 관찰한 미국 남부의 울창한 자연은 아름다울 수만은 없는 세계다. 하지만 마거릿 렌클은 자신의 정원에서 박새를 죽인 집굴뚝새를 미워하지 않는다. 렌클에 따르면 집굴뚝새가 구애할 때 부르는 노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이며, 갈색빛을 띤 작은 몸은 무척 귀엽게 생겼다. 집굴뚝새의 난폭한 본능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작은 몸을 갖고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특성일 뿐이다. 자연은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렌클이 죽은 박새를 발견했던 둥지는 잠시 비워졌다가 다른 박새의 안식처가 되었다.
렌클은 아름답고도 무심한 야생 생물들을 바라보면서 삶에 관한 지혜를 배운다. 미국 남부 지방 대가족 출신인 그녀는 수많은 친척과 함께 성장해 왔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만큼 많은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다. 죽음은 아름답게 찾아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 노쇠함은 늙어 가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도 짐을 지운다. 멋진 추억을 함께했던 기억들은 늙고 병든 몸을 가진 오늘 앞에서 쉽게 휘발해 버린다. 렌클은 자신과 남편을 키워 주었던 어른들을 돌보게 될 때마다 그렇게 지쳐 버리는 마음을 다독여야 했고, 그런 그녀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준 것이 바로 정원에 찾아오는 온갖 생물이었다. 지금껏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기쁨이나 오늘을 무사히 보내야 한다는 절박함마저 지니지 않은, 오직 ‘지금’만을 향해 모든 에너지를 모으는 작은 동물들. 어느 청설모는 ‘청설모 방지 새 모이통’에 입을 들이대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씨앗을 하나씩 뽑아 먹는다. 그때 ‘지금’은 끝을 모른 채 이어진다. 그 작은 동물의 배가 부를 때까지.
성장과 쇠락 속에 공평히 깃든
아름다움을 꼼꼼히 포착하다
렌클은 이 작은 깨달음의 순간들을 공들여 묘사한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담고 있는 교훈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다. 이 책 속의 자연 이야기와 인생 이야기는 마치 서로를 비유하듯 마주 보고 있는데, 독자는 그 비유를 통해 인간이 이 자연 세계의 일부임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먹고 먹히는 새들의 먹이사슬에 관한 이야기는 베트남전에 얽힌 저자 가족의 기억으로 이어지는 식이다. 자연이 때로 소박하지만 기적적인 순간들을 선보일 때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 역시 작은 보석처럼 반짝이는 기억을 남긴다. 어린 시절 성당에서 할머니의 손등을 주물렀던 기억은 이 책에서 가장 덧없이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다.
“나는 올리 할머니의 손을 내 손안에 잡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게 손가락을 가로질러 움직이게 하면서, 할머니의 손이 내 손가락 밑에서 물처럼 유연하게 잔물결을 일으키는 방식에 놀라면서 부드럽게 토닥인다. 올리 할머니의 피부는 할머니의 오래된 성경책과 비슷하다. 그 성경책은 종이가 얇고 모서리가 닳아서 부드럽게 느껴진다. 나는 외외증조할머니의 가운뎃손가락 관절 위 피부를 살짝 꼬집는다. 그런 다음 놓아준다. 그 피부가 몇 초 동안 내가 사는 시대보다 훨씬 전 시대 빙산의 능선처럼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하며 수를 헤아린다. 그것은 천천히, 천천히 내려앉는다. 천천히, 천천히 자신을 바닷속에 던진다.”
태어나는 삶도, 저물어 가는 삶도 모두 각각의 기적적인 순간들을 갖고 있다. 치열하게 먹고 먹히면서도 꿋꿋이 번성을 꾀하는 자연의 흥망성쇠는 이 책 속에서 하나로 이어진 흐름처럼 느껴지며, 거기서 탄생과 죽음은 공평하게 존중받는다. 자신의 온 삶과 이 세상을 허허로운 따뜻함으로 둘러싸는 이 책은 독자들에게 익숙하고 포근한 이불 같은 온기를 선사할 것이다.
복숭아
외할머니가 전하는 내 어머니가 태어날 때의 이야기 | 부리와 발톱이 붉은 |
잠시 쉬며 해피엔딩이 실상 어떤 것인지 숙고해 봅시다
수련
침입자들 | 외할머니가 전하는 사랑하던 개 이야기 | 울부짖음 |
외할머니가 전하는 내가 태어나던 날 이야기 | 파랑새들에게 | 당신들이 나를 바라보던 방식 | 항상 하늘에 있는 건 아니다 | 혈연 | 둥지들
뇌우
폭풍우 속에서, 폭풍우로부터 안전하게 | 비밀 | 견진성사 |
여우와 닭의 우화 | 창문 속의 괴물 | 스노문 | 대청소 | 안전하게, 덫에 걸려 |
여섯 살 때 내가 알던 것들 | 여섯 살 때 내가 알지 못하던 것들 |
전기 충격 요법 | 안개 속에서 | 내가 사랑하는 늑대
큰어치
어치, 집 | 바니 비글이 야구를 하다 | 개울 산책 | 벙커 | 아파치 스노 작전
파랑새
국민 방위군 | 나에게 깊은 즐거움의 이야기를 해 줘 | 도토리 시즌 | 믿음
강
강의 빛 | 붉은 흙길 | 다름 | 잡초
토마토
불완전한 가정의 팔복 | 밤 산책 |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할 때마다 | 충영 |
신혼여행 | 외할머니가 전하는 외외종조부님의 죽음 이야기 |
청설모 막아 주는 핀치 급식기, 평생 보증 | 항상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 |
선로들 | 외할머니가 전하는 외할아버지의 죽음 이야기
금잔화
어머니가 잡초를 뽑다 | 날아가 버리다 | 그리스도 교회 | 이주자들 | 초원의 빛
일식
불의 고리 | 다시 한번,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 내가 잠을 자던 동안
얼룩무늬 새끼 사슴
보기 | 외할머니가 전하는 외외증조할머니의 죽음 이야기 |
홍관조, 일몰 | 황혼 | 외할머니가 전하는 자신이 총에 맞은 날 이야기 |
바벨탑 | 베어 루인드 합창단 | 추수감사절
파랑새
떠들썩한 왕국 | 행진 | 고요하게 | 향수병 | 드러내다
무화과
자연은 진공을 혐오한다 | 둘씩 | 키스 | 난 선택하지 않았지 |
이를테면 브뤼헐의 〈추락하는 이카로스가 있는 풍경〉에서처럼 | 새들은 모두?
인동
전이 | 죽음을 거스르는 행동 | 뭣같은 세상을 찬양하며 | 초크체리
토끼
그는 여기에 없다 | 건강염려증 | 잔해가 취하는 모습 | 빗자루병 |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 유골, 1부 | 두려워하지 마라 |
뇌졸중 | 먼지에서 먼지로 | 어휘 | 가뭄
울새
불면증 | 생일 케이크 만드는 법 | 귀가 | 내가 간직한 것 |
꿈속에서 어머니가 내게 돌아왔을 때
매미
갑옷 | 부활 | 어둠 속에서 | 출구가 없다 | 깔끔한 도주 같은 건 없다 | 유골, 2부
단풍나무
두 번 다시 아니다 | 역사 | 유골, 3부 | 가면을 쓴 |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넌 절대 모를 거야
개똥지빠귀
분리 불안 | 작별 | 보상
제왕나비
늦은 이주 | 가을 이후 | 거룩, 거룩, 거룩
외할머니가 전하는 내 어머니가 태어날 때의 이야기 | 부리와 발톱이 붉은 |
잠시 쉬며 해피엔딩이 실상 어떤 것인지 숙고해 봅시다
수련
침입자들 | 외할머니가 전하는 사랑하던 개 이야기 | 울부짖음 |
외할머니가 전하는 내가 태어나던 날 이야기 | 파랑새들에게 | 당신들이 나를 바라보던 방식 | 항상 하늘에 있는 건 아니다 | 혈연 | 둥지들
뇌우
폭풍우 속에서, 폭풍우로부터 안전하게 | 비밀 | 견진성사 |
여우와 닭의 우화 | 창문 속의 괴물 | 스노문 | 대청소 | 안전하게, 덫에 걸려 |
여섯 살 때 내가 알던 것들 | 여섯 살 때 내가 알지 못하던 것들 |
전기 충격 요법 | 안개 속에서 | 내가 사랑하는 늑대
큰어치
어치, 집 | 바니 비글이 야구를 하다 | 개울 산책 | 벙커 | 아파치 스노 작전
파랑새
국민 방위군 | 나에게 깊은 즐거움의 이야기를 해 줘 | 도토리 시즌 | 믿음
강
강의 빛 | 붉은 흙길 | 다름 | 잡초
토마토
불완전한 가정의 팔복 | 밤 산책 |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할 때마다 | 충영 |
신혼여행 | 외할머니가 전하는 외외종조부님의 죽음 이야기 |
청설모 막아 주는 핀치 급식기, 평생 보증 | 항상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 |
선로들 | 외할머니가 전하는 외할아버지의 죽음 이야기
금잔화
어머니가 잡초를 뽑다 | 날아가 버리다 | 그리스도 교회 | 이주자들 | 초원의 빛
일식
불의 고리 | 다시 한번,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 내가 잠을 자던 동안
얼룩무늬 새끼 사슴
보기 | 외할머니가 전하는 외외증조할머니의 죽음 이야기 |
홍관조, 일몰 | 황혼 | 외할머니가 전하는 자신이 총에 맞은 날 이야기 |
바벨탑 | 베어 루인드 합창단 | 추수감사절
파랑새
떠들썩한 왕국 | 행진 | 고요하게 | 향수병 | 드러내다
무화과
자연은 진공을 혐오한다 | 둘씩 | 키스 | 난 선택하지 않았지 |
이를테면 브뤼헐의 〈추락하는 이카로스가 있는 풍경〉에서처럼 | 새들은 모두?
인동
전이 | 죽음을 거스르는 행동 | 뭣같은 세상을 찬양하며 | 초크체리
토끼
그는 여기에 없다 | 건강염려증 | 잔해가 취하는 모습 | 빗자루병 |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 유골, 1부 | 두려워하지 마라 |
뇌졸중 | 먼지에서 먼지로 | 어휘 | 가뭄
울새
불면증 | 생일 케이크 만드는 법 | 귀가 | 내가 간직한 것 |
꿈속에서 어머니가 내게 돌아왔을 때
매미
갑옷 | 부활 | 어둠 속에서 | 출구가 없다 | 깔끔한 도주 같은 건 없다 | 유골, 2부
단풍나무
두 번 다시 아니다 | 역사 | 유골, 3부 | 가면을 쓴 |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넌 절대 모를 거야
개똥지빠귀
분리 불안 | 작별 | 보상
제왕나비
늦은 이주 | 가을 이후 | 거룩, 거룩, 거룩
저자
마거릿 렌클
1961년 미국 앨라배마주 안달루시아 출신.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문예창작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프리랜서 작가 일을 시작했다. 테네시주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문학 잡지 「Chapter16」을 창간하고 10년 동안 편집장을 역임했다. 2015년에 「뉴욕 타임스」에 연재를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얻기 시작했고, 첫 번째 책인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할 때마다』를 출간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꾸준히 연재와 책 출간을 이어 가며 미국에서 사랑받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역자
최정수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오 자히르』,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 프랑수아즈 사강의 『한 달 후, 일 년 후』, 『어떤 미소』, 『마음의 파수꾼』, 기 드 모파상의 『오를라』, 장 자크 상페의 『꼬마 니콜라의 쉬는 시간』, 이브 생 로랑의 『발칙한 루루』 등 많은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네 쪽 미만의 글들이 모여 보석 같은 패치워크를 이룬다. 그 조각보 안에 자연과 문화와 작가 자신의 가족이 다 담겨 있다.
-「NPR」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 자연 속에서 사는 경험을 할 필요는 없다. 그게 무엇이든, 잠시 멈춰서 다시 살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인디펜던트 북 리뷰」
이 이야기는 자연의 영광과 잔인함을 묘사할 때 특히 빛난다. 렌클은 ‘부패의 광휘’를 생생하게 포착하는 작가다.
-「커커스 리뷰」
-「NPR」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 자연 속에서 사는 경험을 할 필요는 없다. 그게 무엇이든, 잠시 멈춰서 다시 살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인디펜던트 북 리뷰」
이 이야기는 자연의 영광과 잔인함을 묘사할 때 특히 빛난다. 렌클은 ‘부패의 광휘’를 생생하게 포착하는 작가다.
-「커커스 리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