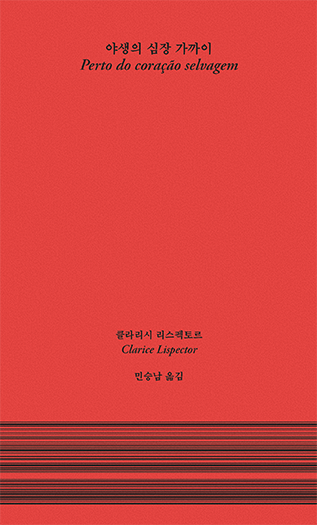
암실문고_
야생의 심장 가까이
아버지
주아나의 날
어머니
주아나의 산책
숙모
주아나의 기쁨들
목욕
그 목소리를 가진 여자와 주아나
오타비우
2부
결혼
선생님에게로 도망치다
작은 가족
오타비우와의 만남
리디아
그 남자
그 남자에게로 도망치다
독사
떠나간 그 남자
여행
저자
클라리시 리스펙토르
1920년에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고, 그해에 러시아 내전을 피해 이주를 결심한 가족과 함께 브라질로 갔다. 1933년에 헤르만 헤세의 『황야의 이리』를 읽고 작가를 꿈꾸기 시작했다. 법대에 진학한 뒤로도 문학 작업을 병행하다 1940년에 첫 단편을 발표했다. 법대를 졸업하고 신문 칼럼니스트로 일하다 1943년에 첫 장편 소설 『야생의 심장 가까이』를 발표했고, 이 작품을 통해 브라질 문단에 충격을 안겼다.
1944년부터 1959년까지 외교관이던 남편과 함께 유럽과 미국 등지를 오가며 작품 활동을 이어 갔지만, 이후로는 남편과 갈라서고 자녀들과 함께 브라질로 돌아와 여생을 보냈다. 귀국한 뒤로는 화재를 겪으며 큰 화상을 입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갔다. 57세 생일을 앞두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난소암으로 사망했다.
생전에 마지막으로 쓴 대표작 『별의 시간』을 비롯해 『G.H.에 따른 수난』, 『아구아 비바』 등 그녀가 남긴 많은 작품은 21세기 들어 브라질 바깥에서도 재조명되며 선풍을 일으켰다. 이때 그녀의 작품을 주도적으로 번역하고 편집한 벤저민 모저는 그녀를 카프카 이후 가장 중요한 유대인 작가로 꼽았다.
역자
민승남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중이다. 2021년 『켈리 갱의 진짜 이야기』로 제15회 유영번역상을 수상했다. 옮긴 책으로 『지복의 성자』, 『시핑 뉴스』, 『넛셸』, 『솔라』, 『데어 데어』, 『바퀴벌레』, 『스위트 투스』, 『사실들』, 『빌리 린의 전쟁 같은 휴가』, 『상승』, 『사이더 하우스』, 『그 부류의 마지막 존재』, 『별의 시간』, 『서쪽 바람』, 『죽음이 물었다』, 『한낮의 우울』, 『천 개의 아침』, 『밤으로의 긴 여로』 등이 있다.
-『더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먼트』
리스펙토르를 읽는 것은 불타는 세상을, 아니, 그보다는, 순식간에 폭발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평평하게 쓸어버릴 수 있는 수많은 불타는 세상들을 건네받는 것과 같다.
-「NPR」
마치 카프카가 여자인 것처럼, 릴케가 우크라이나 출신 브라질 유대인 여인인 것처럼, 만약 랭보가 어머니였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리스펙토르의 글쓰기는 시작된다.
-엘렌 식수(작가, 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