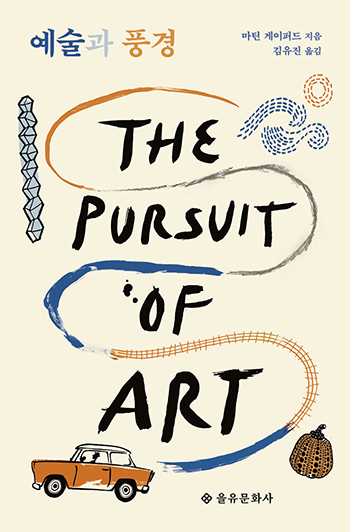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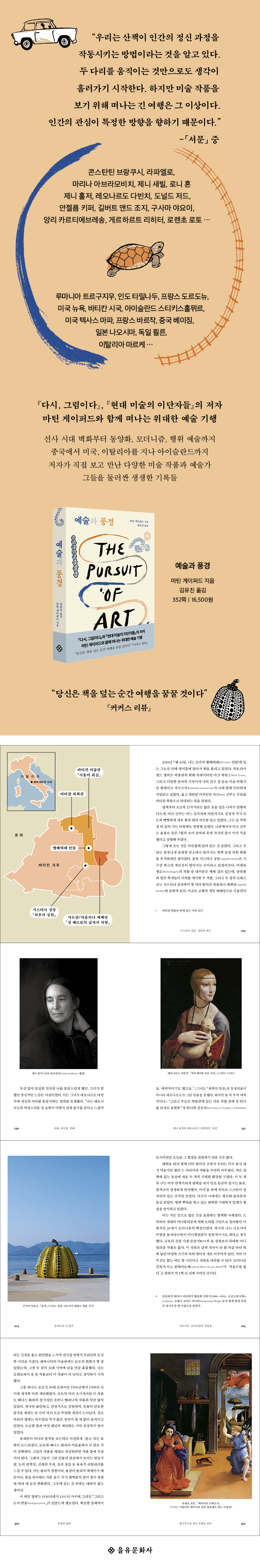
작가, 비평가 그리고 ‘미술 순례자’ 마틴 게이퍼드
비평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담아내다
이 책의 저자 마틴 게이퍼드는 미술 비평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런던의 코톨드인스티튜트에서 미술사를 공부한 그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매체 기고와 출간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려 왔다. 한국에서도 데이비드 호크니와 함께 쓴 『그림의 역사』, 호크니와의 대화를 담은 『다시, 그림이다』, 영국의 화가들과 회화계를 다룬 『현대 미술의 이단자들』 등 여러 책으로 미술 애호가들을 사로잡았다.
이번 기행서는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미술 작품들,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정 기간에 집약되거나 출간 직전에 이루어진 ‘최신’ 미술 여행이 아닌, 25년간의 궤적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그만큼 책이 포괄하는 미술의 시공간적 범위는 넓다. 저자의 비평 활동의 하이라이트를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예술 기행
친근한 필치로 펼쳐진 미술의 다채로운 풍경들
이 책에서 마틴 게이퍼드는 예측 불가할 정도로 다양한 여정에 나선다. 간혹 외진 곳을 찾아가 길을 헤매기도 하고 돌발 상황을 맞닥뜨리는 바람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끝내 목표한 바를 이루면서, 혹은 대안을 통해 새로운 발견을 하면서 특별한 여행을 이어나간다. 무엇보다 그의 미적 욕구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한다. 루마니아에 세워진 콘스탄틴 브랑쿠시의 「끝없는 기둥」, 프랑스 도르도뉴주에서 발견된 선사 시대 동굴 벽화, 일본이 자랑하는 미술 섬 나오시마, 미국 텍사스주 마파에 펼쳐진 도널드 저드의 예술 세계 등 그를 쫓아다니다 보면 세계 일주와 함께 인류사까지 훑어보는 느낌이 든다.
여기에 예술가와 직접 나눈 진솔한 대화들은 기행의 깊이를 더한다. 뉴욕의 로버트 라우션버그, 베니스의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파리의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등 타지에서 만난 현대의 주요 아티스트들은 저자의 노련한 화술에 진심으로 반응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창작자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작품을 만드는지, 개인의 작업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동시에 일련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도 변화하고 있음을 서슴없이 털어놓는다.
무엇보다 이 책은 미술을 무작정 어려워하는 독자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미덕을 갖췄다. 저자는 자신의 기행에 얽힌 실제 경험을 충실히 묘사하면서 미술을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까다로운 비평 용어나 난해한 미술사 계보를 읊는 대신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예를 들면, 콘스탄틴 브랑쿠시의 「끝없는 기둥」을 다루면서 동시대 파리의 큐비즘을 논하는 대신에 루마니아의 시골 풍경과 작품을 둘러싼 공간의 분위기를 묘사하며 작가의 생래적 뿌리를 강조한다. 그리고 길버트 앤드 조지의 ‘상황극’을 설명할 때에는 유럽의 포스트모더니즘을 애써 부각하는 대신, 이들의 작품을 낯설어하는 저자 본인의 모습과 중국이라는 공간이 풍기는 낯선 기운을 활용한다. 이처럼 저자는 자신이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미술 영역이나 낯선 곳에 들어설 때면 불안한 내색을 감추지 않다가도, 그 안에서 익숙한 세계를 발견하고 나면 이내 마음을 활짝 여는 모습을 보인다. 낯설음과 익숙함은 모든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감각이기도 하다.
천의 얼굴을 가진 ‘미술’이라는 예술
가장 중요한 감상법은 ‘직접 경험하는 것’
저자가 설명하는 미술은 자칫 산만하고 개인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열아홉 번의 여정이 주제나 인물에 따라 느슨하게 구분되었을 뿐 시공의 경계를 무시하며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을 계속 읽다 보면 개인적인 애정(혹은 집착)의 일환으로 여겨졌던 ‘미술’이 이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보기 괴로운 자학적 행위, 로니 혼이 빙하 물을 담아 세운 긴 수조들, 길버트 앤드 조지가 자신들을 조각품이라고 주장하는 유쾌한 허풍, 안젤름 키퍼의 대규모 개인 작업실 겸 미술관이 위치한 프랑스 바르작 ‘라 리보트’ 지역 등 저자가 말하는 ‘미술’이란 계속 변화하고 확장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 ‘미술’이라는 예술은 하나의 작품을 뜻하기도 하고, 한 인간이 이룩한 시각적 세계 전부를 의미하기도 한다. 혹은 하나의 시공간에 모여 있는 어떤 덩어리나, 미술 여행 중에 경험하는 특별한 감각을 가리키기도 한다.
무엇보다 저자는 미술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애써 시간을 들여 미술이 존재하는 바로 그곳에 가서 미술과 같은 시공간에 함께 있어 보는 일이 미술적 행위의 완성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저자는 루시안 프로이트 앞에 앉아 초상화 모델이 되어 보기도 하고, 데이비드 호크니와 어울려 시각 이미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등 누구보다 깊은 수준에서 미술 그 자체를 경험하려고 노력한 비평가다. 결국 이 책 역시 미술을 직접 마주한 개인적 경험 없이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생생한 통찰과 묘사를 통해, 미술 전반에 얽힌 애정 어린 이해의 과정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서문
거기에 있기
1. 영원으로 가는 긴 여정: 브랑쿠시의 「끝없는 기둥」
2. 춤추는 신의 땅에서
3.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를 알현하다
선배, 라이벌, 후배
4. 크로마뇽의 낮(과 밤)
5. 제니 새빌: 파도가 부서지는 순간
6. 시스티나 성당: 심판과 계시
7. 제니 홀저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여인’
예술과 풍경
08. 로니 혼: 아이슬란드의 불안한 날씨
09. 텍사스주 마파의 숭고한 미니멀리즘
10. 안젤름 키퍼의 지하 세계로 내려가며
동쪽으로 난 출구
11. 베이징에서 길버트 앤드 조지와 함께
12. 나오시마: 모더니즘의 보물섬
13. 중국의 산을 여행하다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보기
14.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중요한 것은 강렬함이다.
15. 엘스워스 켈리: 눈을 키우기
16. 로버트 프랭크: 항상 변화하는 것
우연과 필연
17. 게르하르트 리히터: 우연은 나보다 낫다
18. 로버트 라우션버그: 엘리베이터의 거북이
19. 필사적으로 찾은 로렌초 로토
감사의 말 / 도판 목록 / 역자 후기 / 찾아보기
거기에 있기
1. 영원으로 가는 긴 여정: 브랑쿠시의 「끝없는 기둥」
2. 춤추는 신의 땅에서
3.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를 알현하다
선배, 라이벌, 후배
4. 크로마뇽의 낮(과 밤)
5. 제니 새빌: 파도가 부서지는 순간
6. 시스티나 성당: 심판과 계시
7. 제니 홀저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여인’
예술과 풍경
08. 로니 혼: 아이슬란드의 불안한 날씨
09. 텍사스주 마파의 숭고한 미니멀리즘
10. 안젤름 키퍼의 지하 세계로 내려가며
동쪽으로 난 출구
11. 베이징에서 길버트 앤드 조지와 함께
12. 나오시마: 모더니즘의 보물섬
13. 중국의 산을 여행하다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보기
14.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중요한 것은 강렬함이다.
15. 엘스워스 켈리: 눈을 키우기
16. 로버트 프랭크: 항상 변화하는 것
우연과 필연
17. 게르하르트 리히터: 우연은 나보다 낫다
18. 로버트 라우션버그: 엘리베이터의 거북이
19. 필사적으로 찾은 로렌초 로토
감사의 말 / 도판 목록 / 역자 후기 / 찾아보기
저자
마틴 게이퍼드
영국을 대표하는 미술 평론가 겸 작가. 영국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주간지 『스펙테이터』를 비롯해 여러 매체에서 미술 비평을 해 왔다. 미술가들과의 활발한 교류로 루시안 프로이트, 데이비드 호크니가 그린 초상화에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저서로 『현대 미술의 이단자들』, 데이비드 호크니와의 대화를 담은 『다시, 그림이다』, 호크니와 함께 쓴 『그림의 역사』 등 다수가 있다.
역자
김유진
영국 런던에서 미술사 공부를 한 후, 미술관과 미술 관련 언론에서 일했다.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몇 권의 책을 편집했으며, 현재는 전문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미술부터 요리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미감에 관련한 외서를 국내에 소개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 마틴 게이퍼드의 『예술과 풍경』을 번역했다.
“당신은 책을 덮는 순간 여행을 꿈꿀 것이다” - 『커커스 리뷰』
"'미술을 찾아서 멈추지 않는 여행을 떠난다. 많이 볼수록 더 보고 싶어진다'는 마지막 구절이 비대면의 시대,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새삼 깨닫게 한다." - 『조선일보』 곽아람 기자
"'미술을 찾아서 멈추지 않는 여행을 떠난다. 많이 볼수록 더 보고 싶어진다'는 마지막 구절이 비대면의 시대,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새삼 깨닫게 한다." - 『조선일보』 곽아람 기자








